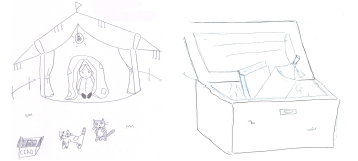대학생이 인식한 주거의미 및 20년 후 주거환경계획 : 2017년 연구 결과와의 비교분석
ⓒ 2024,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 of housing and ideal residential environment plans for college students and compare findings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We analyzed drawings and explanatory data of 137 college students taking liberal arts courses at K University in the Jeonbuk reg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college students, housing was perceived as having various functional and symbolic meanings rather than just a physical building.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housing as an emotional place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econd, an ideal residential environment planned by college students was widely distributed, including interior environment, exterior of the house, and local environment. Interest in indoor environment planning continues to be at a high level.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local environment plans. Third, the most common planning elements for an ideal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physical performance of the residence and planning f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rrounding environment plans saw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ns compared to 2017, which was noteworthy. Fourth, housing value was in the order of individuality and privacy, health and comfort, location, sociability, efficiency, and aesthetics. Especially, the value of elemen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ociability became importan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by analyzing housing-related consciousness and values i n detail through addition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Keywords:
College students, Meaning of housing, Housing perception, Plans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Housing value키워드:
대학생, 주거의미, 주의식, 이상적 주거환경, 주거가치Ⅰ. 서론
주거는 정서적 애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로 개인의 지위, 프라이버시 및 정체성을 내포하는 곳(이현주 외, 2021)이며, 반복적인 일상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집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개인과 공간간의 다양한 관계가 형성된다(이지선, 이영민, 2019). 최근 4차 산업혁명, 팬데믹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상황을 겪으면서 주거는 일상생활과 휴식, 가족과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집의 기본적인 기능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홈루덴스, 레이어드홈, 올인홈과 같은 단어로 주거의 탈경계, 경험성, 복합성이 설명되는가 하면(조현경, 서지은, 2021), 거주자들로 하여금 삶의 질과 깊이 연관된 집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김성훈, 2022),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뿌리이자 인간존재의 근거지로서의 집의 의미(윤호, 2014; 이지선, 이영민, 2019)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물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그들의 보호아래 주어진 주거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주거선택 시 의사결정이나 고려사항들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재학 중 자취를 하며 스스로 주생활을 영위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나, 기숙사나 학교 주변 원룸 등의 주거유형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유형 또한 대학재학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심승규, 지인엽(2021)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35세를 전후로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집을 마련한 뒤 주택시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 및 자녀의 초등학령기 이전에 주거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며, 부모나 보호자와의 주거생활, 대학 혹은 사회생활 초기의 경험을 통해 주거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윤호(2014)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들만의 감각적, 개성적 문화를 형성하여 주거 관련 요구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자율적인 주거선택이 어려우나 향후 잠재적 주거수요자로서 대학생들의 주거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미래에 희망하는 주거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거의 정책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2017년 실시한 동일 연구(이민아, 유복희, 2017)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이들의 집에 대한 인식과 주거가치의 전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래 주거소비자인 대학생들의 주거에 대한 의식과 선호 및 필요 사항, 그리고 변화 경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주거개발과 계획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 1-1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거의미는 개인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1-2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거의미는 2017년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가?
- 1-3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거의미의 세부내용은 어떠한가?
- 2. 우리나라 대학생이 계획한 20년 후 이상적인 주거환경은 어떠한가?
- 2-1 대학생의 20년 후 주거환경 계획범위, 계획요소, 주거가치는 개인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2-2 대학생의 20년 후 주거환경 계획범위, 계획요소, 주거가치는 2017년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가?
- 2-3 대학생의 20년 후 주거환경 계획범위와 계획요소의 세부 내용은 어떠한가?
Ⅱ. 문헌 고찰
1. 주거의 의미 및 주거 가치
주거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거주자의 삶과 공간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로 그 범위는 주거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그 안에서 거주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다(최윤정 외, 2024). 또한, 주거는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이미지의 확장이며, 실존철학 관점에서 내면과 외부 세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사회적측면에서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주거 수준을, 그리고 소비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경제 및 산업과 밀접한 생산품이다(주거학연구회, 2013). 이경희 외(1993)는 주거의미를 친밀감, 사회적관계, 자아정체감, 사생활과 피난, 계속성, 개인화, 활동근거, 유년기가정, 물리적 구조물로 분류하였고, 신화경, 조인숙(2014)은 가족조화 및 단란, 정서, 사회적 지위표현, 일상생활, 사회적관계, 경제, 자아실현, 안전, 사생활 보호공간의 9개 유인으로 명명하였다. 주거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박은아, 이연정(2011)은 존재의 기반, 가족교류, 휴식처, 미래의 준비, 또 다른 일터, 자신의 표현, 사회적지위, 자기성취도 평가, 재산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한편, 주거가치는 주거의 조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윤신영, 강순주, 2018)이다. 주거가치는 주거행동의 동기가 되는 주거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마다 다른 비중으로 나타나(주거학연구회, 2013), 미래의 주거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념이다(임혜리 외, 2012). Cutler(1947)는 주거가치를 심미성, 안락성, 편의성, 경제성, 건강,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성, 입지, 개인 관심으로 분류하였고, Beyer(1959)는 심미성, 자유, 정신건강, 신체건강, 경제성, 가족중심, 평등, 여가, 체면을 들었다(구혜경, 조희경, 2015 ’재인용’). 국내연구에서는 정보첨단 및 전통 추구(강순주, 2004), 교육(임혜리 외, 2012), 혹은 효율성, 기능성, 친환경성(김지숙, 양세화, 2010) 등의 주거가치가 포함되는 등 학자들마다 다양한 요소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2.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의미, 주거가치 인식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 및 청년층이 생각하는 주거의미, 주거인식, 주거가치, 선호하는 주거환경, 주거선택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주거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주거를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사생활보호 및 일상생활 공간 등으로 인식하였고(신화경, 조인숙, 2014), 이지선, 이영민(2019)의 연구에서 원룸에서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만 19~34세미만)는 집 보다는 동네에 대한 애착이 컸으며, 취향에 맞는 공간배치, 물건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외(2021)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주거의 공적기능보다는 사적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과거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주거의 보건/휴식 기능이 증가한 반면 가족 단란과 화합기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임희경, 2005), 아파트(주서령, 김도연, 2014), 혹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비슷한 비율(이현정 외, 2012)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었다. 입지적 측면에서 교통이 편리한 도시근교(임희경, 2005; 주서령, 김도연, 2014)나 대도시 거주를 선호(안옥희 외, 2009)하는 등 도심과의 인접성, 번화한 지역, 주요 활동공간과의 근접성이 매우 중요하였다(김준형, 2021). 주변의 편의 인프라와 함께 주택특성 및 물리적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윤호, 2014; 이현정 외, 2012; 정수진, 한정원, 2017), 시청각 프라이버시와 개성표현, 집에서의 여가생활, 개인공간 등(정수진, 한정원, 2017) 개성과 사적인 생활을 충족시킬 만한 공간의 필요도가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생활 행위의 변화를 조사한 김태완, 장미선(2021)의 연구에서는 다기능적 공간, 내 공간에 대한 관심, 공간 개선의 필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들은 경제성이나 사회적지위, 이웃과의 관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었는데(신화경, 조인숙, 2014), 20대와 30대 후반까지의 청년층이 포함된 최근 연구에서는 쾌적성과 안전성, 입지 및 직장과의 접근성과 더불어 집의 자산가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지은영, 2021). 앱(오늘의 집)에서 나타난 주거특성 선호를 조사한 김영진 외(2022)의 연구에서 1인 가구는 통창 및 높은 천정고를 이용한 전망과 개방감, 프라이버시, 사적 및 공적공간의 분리, 공간의 다목적 활용, 발코니의 취식 공간화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1인가구로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요구 경향에 참고할 만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주로 언급되었다. 여학생은 쾌적성(김아롬 외, 2014), 혹은 소박한 나만의 휴식공간(정미렴, 2023)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거주변화 지향적이며 모든 요소를 골고루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곽경숙, 2007; 임희경, 2005). 이외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소영, 엄순철(2018)의 연구에서 여성은 실내분위기 및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주거요구가 높았다. 반면, 남학생은 외부환경과 교통조건을 중시하였고(임희경, 2005), 정미렴(2023)의 연구에서 남성 청년층은 대부분 문항의 응답값이 중간으로 ‘누구에게나 괜찮은 집’으로서의 주거관 비율이 높았다.
연구의 연도별로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최근 대학생 및 청년층은 주거의 사생활 보호와 정서적 유대감, 보건 및 휴식기능을 중요시하며, 도심지 및 주변 인프라와 더불어 개인생활공간, 여가공간과 개성표현, 나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통창, 높은 천정고와 같은 개방성과 쾌적성, 공간의 기능 분리, 테라스와 같은 다목적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여성이 안전성, 쾌적성, 내구성, 실내 환경, 개인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 내 K대학에서 운영하는 주거학 관련 교양과목의 2022년(2학기)과 2023년(1, 2학기) 수강생 146명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이 인식하는 주거의 의미와 20년 후 본인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주거의 의미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주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강신청 변경이 끝난 2주차에 조사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집이란?’이라는 문제에 대해 A4 용지에 그림과 설명으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약 30분의 시간을 주었다. 20년 후 이상적인 주거환경은 주거 관련 다양한 의미와 유형, 용어(주거욕구, 주거가치 등), 주거경험, 주거공동체, 친환경 등과 같은 포괄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한 후 7주차에 수집하였다. ‘나의 20년 후 이상적인 주거환경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향후 직업, 취미, 함께 하는 사람들, 주거가치 등을 생각하여 A3 용지에 그림과 설명으로 계획하고, 약 1시간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주변 환경 및 단지, 주택유형, 외관, 실내공간이나 디자인 세부사항, 장식 등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전공, 연령, 성별, 거주지역, 현재 주거유형, 주거유형 거주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46명 중 결석, 미제출, 자료의 미비함 등으로 인해 137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주거의 의미는 130사례, 이상적인 주거환경은 131사례가 분석되었다.
2. 자료 정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2017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각 분석 항목에 대해 동일한 요소로 분류하였고, 각 요소별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하였다<표 1>, <표 2>.
주거의미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표현을 9개 요소(신화경, 조인숙, 2014; 이경희 외, 1993)-정서적 장소, 일상생활 활동, 가족조화 및 단란, 사생활 및 피난처, 자기정체성, 물리적환경, 사회적 유대, 사회적 지위, 경제성-로 분류하였다. 이상적인 주거환경계획도 2017년 연구와 동일하게, 그림과 설명에 나타난 주거환경 계획의 범위(지역, 대지 및 단지환경, 외관특성, 실내환경), 주거환경 계획요소(물리적 성능, 주변환경, 사회경제적특성, 디자인디테일, 이현정 외, 2012)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은하, 김석태(2023)가 언급했듯이 주거선택 및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며, 미래 주거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기에 좋은 측정 도구인 주거가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지숙, 양세화(2010)와 Cutler(구혜경, 조희경, 2015 ‘재인용’)의 연구를 참고하여 9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리를 위해 사례별로 각 요소에 대한 인식 혹은 고려 여부에 따라 0, 혹은 1로 코딩하였고, 각 요소에 대한 인식 혹은 고려,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7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0점에서 3점까지 부여하였으며, 3회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은 빈도와 퍼센트, 평균(Mean)을,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는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017년의 연구 결과 중 해당 요소별로 나타난 빈도(관찰빈도 및 기대빈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의 평균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 그림과 글에 대한 세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전체사례 기준(N=137) 분석 대상자는 만 나이 기준으로 20세 이하(59.9%),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전공자(59.1%)가 조금 많았고, 성별은 남녀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각각 51.8%, 48.2%). 현재 본가의 지역은 동지역(78.8%), 주거유형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75.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주 경험으로는 공동주택 거주경험이 9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43.1%), 기숙사(38.0%), 원룸(15.3%) 순이었다. 전체 분석 사례 및 주거의미, 20년 후 주거환경 계획 분석 사례의 대상자 특성을 <표 3>에 정리하였다.
Ⅳ. 결과 및 분석
1. 주거의 의미
주거는 대학생들에게 정서적 장소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가장 많았고(각각 56.2%, 50.0%), 부여된 점수의 평균도 각각 0.73점과 0.74점으로 다른 의미 요소에 비해 높았다<표 4>. 다음으로 가족조화 및 단란(23.8%), 사생활 및 피난처(20.8%), 자기정체성(13.1%)의 순이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 사회적지위를 나타내는 장소로서 의미를 둔 경우도 5건(3.8%)이 있었다. 주거의 경제적 의미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이 주거를 소유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주거의 재산 및 투자가치, 비용 등의 인식이 드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들의 개인 특성별로는 여학생과 기숙사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주거를 정서적 장소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p<.05). 여학생들이 주거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 크고, 또 비교적 단체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기숙사 경험이 주거의 정서적 특성을 중요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및 피난처 의미의 경우, 동 지역 거주 학생들이 읍면 지역 학생들에 비해 주거의 사생활 및 피난처 특성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었다(p<.01). 또한, 원룸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주거의 자기정체성 인식 정도가 낮아(p<.05), 실내 공간구획이 모호한 원룸에서의 생활이 소위 ‘집은 곧 나’라고 하는 주거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조사(이민아, 유복희, 2017)와 비교한 결과, 주거를 단순 물리적환경으로 인식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5>. 카이제곱 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본 결과, 주거를 정서적 장소로 인식한 학생이 크게 증가한(p<.001) 반면, 단순한 물리적 환경으로 보는 학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을 통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거에 내포된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인식하였으며, 특히, 집이 부여하는 편안함, 안락함과 같은 정서적 의미를 인식한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연구(이현주 외, 2021)에서 가족단란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사적기능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족조화 및 단란 의미가 사생활 및 피난처보다 변함없이 우위를 점하고는 있으나 그 차이가 약간 감소하여, 향후 연구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t 검정을 통해 각 의미별 인식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장소를 제외한 모든 의미의 평균이 낮아졌다. 대학생들은 최근 주거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일상에서 집이라는 장소가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재확인하고, 추가 면접 등을 통해 그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주거는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53건), 사랑과 행복(24건), 그리고 회복(11건)의 감정을 제공하는 장소였다<표 6>. 주로 은유적 표현으로 아늑한 침구류(이불, 침대, 베개), 구름이나 솜, 혹은 평화로운 자연환경(야자수와 바다, 산과 물, 꽃 밭에 누워있는 모습 등)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하트와 행복함이 모여있는 집합체로서 사랑과 행복을 표현하였다. 충전기와 자양강장제, 힘든 일을 겪은 뒤 돌아가는 회복의 장소로서 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는 취침이 가장 많았고(50건), 다음으로 식사(18건), 운동 및 취미(13건), TV 시청(9건) 학습 및 독서(6건) 등이 있었다. 주로 침대, 이불, 거실의 TV, 식탁 및 음식, 운동기구, 책상 및 책장, 컴퓨터 등 실내공간에 배치된 가구와 설비를 그려서 일상생활을 표현하였다.
가족조화 및 단란은 가족의 얼굴을 그려 구성원을 나타냈고(16건), 소파와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가족들 간의 대화, 혹은 오락과 같은 즐거운 시간(15건)을 그리거나 설명하였다. 사생활 및 도피처로서의 주거의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10건), 나만의 공간과 생활을 보장받는 것(10건),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 및 도피(9건)를 나타냈다. 학생들은 이를 꾸밈없이 부스스한 본인의 진짜 모습, 혹은 우주, 게르와 같이 독립된 공간, 외부의 위해 요소(악천후 및 스트레스, 압박감, 피곤함 등)로부터 보호되는 집 등으로 표현하였다.
자기정체성은 본인의 개인적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거나(8건), 이상적 주거환경 및 가치를 두는 주거 요소(6건)와 주거의 상징적인 의미(3건)를 표현하였다. 주거를 본인이 좋아하는 반려동물, 물건, 소품이 있는 장소로 표현하거나, 희망하는 주택의 외관과 공간 요소, 가구 등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추억과 기억이 보관된 금고 혹은 요람이자 무덤인 장소 등 상징적인 표현도 있었다. 물리적환경은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외관, 도면, 단지설비 등을 표현하였다. 한편, 적은 건수지만 2017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 유대는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 및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설명하였고, 사회적 지위는 “명예”, “지위”와 같은 단어로 언급하였다.
2. 이상적인 주거환경
(1) 개요
대학생들이 작성한 “20년 후 나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에 나타난 주거환경 계획의범위를 분석하였다<표 7>. 약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대지 및 단지환경을 계획한 반면(48.1%), 70%이상이 지역환경(77.9%), 주택외관(83.2%), 실내환경(83.2%) 관련 계획을 하였으며, 이 중 실내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었다(M=2.01). 지역환경은 주택외관에 비해 표현된 빈도는 약간 낮았으나, 점수는 높게 나타나(각각 M=1.62, 1.21), 이상적인 주거계획에 있어서 지역환경의 중요도를 크게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특성별로, 기숙사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역환경 계획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p<.05), 주택외관 계획은 낮았다(p<.05).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재학 중 지역 내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 학교 주변 지역환경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지 및 단지환경 계획은 21세 이상의 학생들이 20세 이하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p<.05), 해당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 혹은 공동주택경험이 있는 학생이 실내환경을 중요하게 계획한 경향이었다(각각 p<.001, p<.05). 이소영, 엄순철(2018)의 연구에서 여성이 실내분위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경험이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주거개발에 있어서 실내환경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로 판단된다.
2017년 조사(이민아, 유복희, 2017)와 비교한 결과<표 8>, 대지/단지환경을 제외한 대부분 계획 범위의 비율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환경과 실내환경 계획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각 p<.001). t 검정을 통해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역환경 계획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p<.001), 대지 및 단지환경과 주택 외관 계획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각각 p<.01, p<.001). 2017년에 4개의 계획 범위 중 가장 낮은 빈도와 점수를 나타냈던 지역환경 계획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주거의 입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높아진 최근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주택 외관의 경우 계획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주거유형 정도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고, 외관의 세부적인 선호 및 요구사항이 많았던 2017년과 비교하여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 내용분석
<표 9>를 보면 지역환경 계획에서 위치에 대한 표현(50건, 49.02%)이 2017년(23건, 22.5%)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여 높아진 관심을 알 수 있다. 시골 혹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22건)와 도심(19건)이 비슷하였고, 도심의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심외곽(9건)도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김준형, 2021; 안옥희 외, 2009; 임희경, 2005; 주서령, 김도연, 2014)에서 대학생 및 청년계층이 대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도시근교, 번화한 지역을 선호하거나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결과와는 달랐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조사 대상이 서울 및 광역시 대학생 혹은 청년층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환경 계획에서 주변 환경으로는 시골 지역의 좋은 경관(예: 산, 나무, 강, 바다) 및 공원, 산책로와 같은 자연환경(57건), 혹은 다양한 근린시설(51건)을 표현하였으며, 이 2가지를 동시에 계획한 경우가 많았다.
대지 및 단지환경은 마당 혹은 단지 내 녹지/텃밭(39건)을 표현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여가시설(17건), 주차장(13건) 등을 표현하였다.
주택의 외관계획을 통해 주거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단독주택의 형태가 많았고(64건, 58.7%, 업무/주상복합형 3건 포함), 공동주택은 48건으로(연립주택 2건 포함, 44.0%), 현재 주거유형(공동주택 75.9%, 단독주택 24.1%)에 비해 단독주택 희망이 높았다. 다만, 2017년 조사에서 단독주택 80.7%, 공동주택 16.9%였던 것에 비하면 공동주택 거주계획의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데크, 테라스, 발코니 등을 그렸고, 한옥주택이나 캔틸레버 형식의 독특한 구조를 나타내기도 한 반면, 공동주택은 대부분 빌딩의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실내환경은 희망하는 공간구성(60건), 관심 있는 공간의 세부 디자인을 표현하거나(39건), 전반적인 가구배치를 계획하기도 하였다(15건).
(1) 개요
이상적인 주거환경의 주요 계획요소를 분석한 결과, 주거의 물리적 성능과 주변환경을 계획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각각 77.7%, 75.6%), 중요도에 있어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각각 M=1.58, 1.31)<표 10>. 이는 선행연구(윤호, 2014; 이현정 외, 2012; 정수진, 한정원, 2017)에서 대학생 및 청년층이 주변 인프라와 주택특성 및 물리적 성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주거의 물리적 성능과 주변 환경은 대부분 입주 전에 결정되거나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개발 시 주목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자인 세부사항(58.0%), 사회경제적특성(45.8%) 순이었다. 개인적 특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거의 물리적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계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2017년 조사(이민아, 유복희, 2017)와 비교한 결과, 주거의 물리적 성능 요소는 큰 변화 없이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계획되었고, 그 외 요소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주변환경 계획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표 11>. 이는 앞에서 분석한 주거환경 계획의 범위에서 지역환경 계획의 유의한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t검정에서는 주변환경 계획의 평균이 증가한 것(M=1.29에서 1.54로 증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주거의 물리적성능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서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는 있으나, 2017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1).
(2) 내용분석
주거환경 계획 요소별로 대학생들의 그림과 세부 설명을 분석하였다<표 12>.
① 물리적 성능
물리적 성능은 공간성능(86건, 85.1%)과 환경성능(59건, 58.4%)으로 분류하였다.
공간성능 요소에는 조닝(50건), 공간 연계 및 개방(31건), 공간 분리(22건), 공간 면적(17건), 공간의 다목적화(13건), 그 외 층고, 방의 수, 구조 등의 계획이 있었다. 조닝은 단층인 경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취미공간 등 용도별 조닝이 많았고, 2층 이상인 경우 1층을 가족생활공간이나 공용공간, 2층 이상에 개인 작업 및 취미여가 등의 공간을 두었다. 공간연계는 테라스를 거실이나 침실, 식당과 연계시키거나, 침실과 취미여가공간, 실내공간과 마당의 연계를 강조하는 등 실내외 공간의 소통을 꾀한 경우였다. 공간 개방의 방법으로는 실내의 문 제거, 벽의 최소화, 유리벽 등을 활용하였고, 대지 내 주택과 분리하여 헬스장, 족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운동공간을 두었다. 공간의 다목적화는 하나의 공간을 휴식과 독서, 모임, 공부, 취미여가, 모임, 식사 등 개인 여가와 사회적 소통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거실, 작업실, 안방, 마당, 발코니 등이 활용되었다.
환경성능 관련 설비로 창호설비(39건), 보안 및 사생활 유지설비(17건), 일상생활 설비(12건), 차광설비(5건) 등이 있었고, 기타 향, 방음, 태양광, 기능적인 수납설비 등을 강조하여 계획하였다. 창호설비는 채광목적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조망 및 외부 관찰과 환기, 개방성을 위한 통창 등으로 계획하였다. 보안 및 사생활 유지설비는 담과 울타리, CCTV를 비롯한 현관 보안설비, 그 외 중문, 높은 대문이 있었다. 일상생활 설비로는 욕조설비와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설비(예: 디귿자, 식기세척기 등)를 표현하였고, 차광설비로 암막커튼과 가림막 등을 계획하였다. 2017년 연구에서 많이 나타났던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IT 등과 관련된 설비계획이 드물었고, 보안 및 사생활 유지설비 계획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뉴스 및 미디어 등을 통해 강조되어 온 친환경 주거 관련 교육 방법을 새롭게 정비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친환경 주거와 지구환경, 일상생활 속 개인 건강의 관계를 강조하는 교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 중 자연환경(57건, 57.6%)은 산, 숲, 공원, 산책로 등 녹지가 가장 많았고(42건), 다음으로 연못, 강, 바다와 같은 수변환경(14건), 그 외 쾌적한 공기환경(4건)을 강조하였다. 근린시설(51건, 51.5%)의 경우 마트, 편의점, 카페, 음식점, 세탁소와 같은 일상 편의시설(3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헬스, 볼링, 수영장, 영화관, 노래방 등과 같은 여가문화시설(14건), 교육시설(10건), 대중교통(8건), 의료시설(7건), 파출소 및 경찰서(6건)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주변을 주택가로 계획한 경우(9건)도 있었다. 2017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의료시설과 치안시설(파출소 및 경찰서)을 배치하여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회경제적 특성
20년 후 주거환경 계획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교류공간 계획(41건, 68.3%)이 많았는데, 가족 간 교류는 주로 실내의 거실에서(15건), 이웃 및 친구, 지인과의 교류는 실외공간인 마당과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하는 경향이었다(15건). 그외 식당, 테라스 및 발코니, 동네의 주민 모임 공간이나 홈카페, 서재, 영화관, 수다룸과 같은 특별히 만든 공간, 실내외 운동시설 등도 계획하였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과의 일상적인 교류를 위한 주거 근접을 강조하는 한편(17건, 28.3%),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동네의 평판 및 주변 이웃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요구되었는데(10건, 16.7%), 고급 주거단지 및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웃을 강조하거나, 아이들, 혹은 은퇴자가 많은 동네, 차분한 성향의 이웃 등을 언급하였다.
④ 디자인 세부
디자인 세부 계획을 대지 및 단지 계획(47건, 61.8%), 외관디자인(35건, 46.1%), 실내공간계획(56건, 73.7%)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대지 및 단지의 세부 계획으로는 자연환경과 조경, 꽃을 주로 강조하여 표현하였고(28건), 그 외 텃밭, 놀이 및 운동시설, 반려동물 배려시설, 테이블/의자/벤치와 같은 휴게시설, 경관조명, 연못, 정자 등이 있었다.
외관디자인은 건물의 외관 형태를 세부적으로 표현하였고(29건), 그 외 데크, 테라스, 발코니 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한다거나, 창호(예: 통유리, 아치창, 원형창, 가로로 긴 창, 아치형 대문 등) 및 계단의 형태, 캔틸레버, 필로티, 중정 등 구조적인 특이성을 나타냈으며, 분위기, 스타일(예: 모던, 한옥)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희망하는 외관의 색채(예: 빨간지붕, 하얀벽, 무채색 등)와 재료(예: 벽돌, 목재, 통나무)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실내공간의 세부계획으로는 특정공간(예: 거실, 테라스 침실, 주방, 개인 작업실 등)의 세부구성이 많았고(38건), 다음으로 주거 전반의 세부 공간구성, 소품계획(예: 편백향, 나무/식물, 인형 등), 실내 공간 및 설비의 형태(예: 중정형거실, 다다미방, 아치형 중문, 곡선형 벽 등)를 강조하거나, 전반적 스타일과 분위기(예: 모던, 미니멀리즘, 심플 등), 색채계획(예: 우드톤, 화이트우드, 블랙그레이 등), 마감재(예: 목재, 유리, 포세린) 및 조명(예: 샹들리에, 간접조명, 야간조명 등)을 계획하였다.
대학생의 20년 후 이상적인 주거환경 계획에 나타난 주요 주거가치를 분석한 결과, 개성 및 프라이버시가 가장 많았고(71.0%), 다음으로 건강 및 쾌적성(59.5%), 입지(55.7%), 사회성(39.7%), 효율성(30.5%), 심미성(22.9%), 안락성(9.9%), 안전성(9.4%), 경제성(1.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청년층 대상 선행연구에서 내 공간에 대한 관심(김태완, 장미선, 2021), 시청각 프라이버시와 개성표현(정수진, 한정원, 2017) 등의 필요성과 주거관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거의미에서 낮은 비율이었던 프라이버시와 자기정체성 관련 특성이 주거 가치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대학생들의 현재와 미래 주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각 주거가치별 점수에서도 크게 다른 점이 없었던 반면, 입지 관련 가치가 건강 및 쾌적성 가치보다 빈도는 낮았으나 좀 더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었다(각각 M=1.04, 0.95). 개인적 특성별로 여학생이 개성 및 프라이버시, 건강 및 쾌적성, 안전성 가치를 남학생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각각 p<.01, p<.05, p<.05), 선행연구에서 여대생 및 여성 청년층이 나만의 휴식처(정미렴, 2023), 쾌적성(김아롬 외, 2014), 안전성(이소영, 엄순철, 2018)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20세 이하, 혹은 기숙사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이 주거의 효율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각각 p<.05), 21세 이상의 학생은 건강 및 쾌적성에 가치를 두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05). 한편, 동지역에 거주하거나(p<.05),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p<.01), 혹은 공동주택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p<.01) 안락성에 대한 주거가치가 강하게 나타났고, 원룸 거주경험이 없을 경우 안전성 가치 성향이 높았다(p<.01).
2017년의 조사(이민아, 유복희, 2017)와 비교한 결과, 심미성과 안락성을 제외한 대부분 주거가치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 한 사례도 없었던 경제성 가치도 2건이 나타났다<표 14>. 이 중 입지(p<.001)와 사회성(p<.05)에 대한 주거가치는 유의하게 증가하여, 최근 대학생들이 지역적 특성 및 근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며, 개인 프라이버시와 동시에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주거가치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입지, 사회성, 안전성의 점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주거가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강 및 쾌적성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거의미와 20년 후 이상적인 주거환경 계획의 분석 및 이전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국내 주거개발 계획의 방향 설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의 K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37명의 그림 및 설명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다양한 기능적, 상징적 의미로 인식되었고, 특히, 정서적 장소로서 주거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학생 및 기숙사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주거를 정서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고 동지역 거주 학생에게는 사생활 및 피난처 의미가 강했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정서적 의미 이외의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인식의 강도가 낮아져, 대학생들의 일상에 주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자취생들의 주요 거처인 원룸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주거의 상징적 의미라 할 수 있는 정체성에 낮은 인식을 나타내, 질적으로 높지 않은 주거환경 및 모호한 공간구획을 가진 주거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이 계획한 이상적인 주거환경은 실내환경과 주택외관, 지역환경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기숙사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지역환경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주택 외관계획에는 낮은 관심을 보였고, 여학생과 공동주택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실내환경을 중요하게 계획하는 경향이었다. 2017년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실내환경 계획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건수와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낮았던 지역환경 계획이 크게 증가한 점, 그리고 단독주택 계획이 여전히 많지만 공동주택 거주 희망이 증가한 점은 향후 주거권역과 주거유형의 개발 및 계획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이상적인 주거환경의 계획요소로 주거의 물리적 성능과 주변 환경 계획이 가장 많았다. 물리적성능은 2017년에도 가장 중요하게 계획되었던 요소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고, 공간의 조닝, 개방성, 다목적성 등 공간구성 관련 요소와 보안 및 사생활 유지 목적의 계획이 많았다. 반면,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설비계획이 거의 없어 최근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지구환경이나 에너지효율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17년에 비해 계획 건수가 급증한 주변환경 계획, 즉 주변의 자연환경과 근린시설 계획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며, 특히 편의시설과 함께 건강과 안전, 보안관련 시설(의료, 치안시설 등)에 대한 선호가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특성 관련 계획은 건수는 낮지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동네의 평판 및 수준, 이웃특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넷째, 주거가치는 개성 및 프라이버시, 건강 및 쾌적성, 입지, 사회성, 효율성, 심미성 등의 순이었고, 여학생이 개성 및 프라이버시, 건강 및 쾌적성, 안전성 등 남학생에 비해 다양한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상위 주거가치 중 입지와 사회성은 2017년에 비해 유일하게 건수와 중요도 모두 높아진 요소였는데, 앞에서 언급했듯 최근 주거권역 내 근린환경 요소에 대한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사적인 생활의 보장과 함께 사회성, 즉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 또한 향후 주거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다. 주거의 기본기능으로 인식되는 안락성은 동지역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가치를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과 함께 향후 주거정책과 개발의 방향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집의 정서적 의미는 예전에 비해 매우 강화되었고, 미래의 이상적 주거환경 계획에서는 개인 생활과 사회적 교류의 균형을 만족하는 공간기능과 지역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실내외 공간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취미, 여가와 같은 사적인 생활 및 쾌적성과 실내외의 개방성을 도모하는 환경설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집 안에서 가족과의 교류, 그리고 대지 및 단지 내에서 지인, 이웃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주거권역 및 단지 개발 시 자연환경 조성 및 근린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거주자들의 연령과 생활주기를 분석하여 권역별 정체성 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현재 거주지역과 주거유형, 그리고 거주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이 주거의 정서적 의미를 강하고 인식하고, 주거의 실내환경 및 물리적성능 계획, 그리고 개성 및 프라이버시와 건강 및 쾌적성 가치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점은 향후 국내 주거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주거의미와 주거환경 요소 전반에 걸쳐 낮은 관심도를 보인 남학생의 선호사항 관련 세부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연구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한 동지역 및 공동주택 거주,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경험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내공간의 사적인 생활 보장 및 안락성 가치에 대한 지속적 도모가 필요하다. 또한 본가에서 통학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주거대안인 기숙사, 혹은 원룸의 거주경험이 주거의 자기정체성 의미, 안전성 혹은 효율성 가치에 낮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측면에서, 기숙사와 원룸 공간의 부정적 영향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공간 거주자들에 대한 주생활 행동 조사를 통한 확인 및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의 다양한 의미와 이상적 주거환경 계획의 각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고려의 빈도는 2017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그 강도에 있어서 감소하였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현재 본인들의 주거 상황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면밀한 심층면접 등의 조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올바른 주거인식 및 향후 주거선택, 그리고 친환경 주생활 및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개인과 공공을 위한 일상에서의 주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주제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기에 설문조사와 같은 구조화된 도구를 통한 조사 방법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를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잠재적 인식과 생각을 자유롭게 불러일으키는 데 효율적인 그림과 부수적 설명 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래 주거 소비자의 주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미래 주거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20년 후 이상적 주거환경은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요구와 선호사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주거확대기 및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환경 계획에도 참고할만하다. 향후 추가적인 질적연구를 통해 일상적 주생활 행동과 주거관련 의식 및 가치를 세부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 주거개발에 보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4년도 한국생활과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References
- 강순주(2004). 주거가치관에 따른 인텔리전트 주택 선호도. 가정과삶의질연구, 22(5), 101-111.
- 고은하, 김석태(2023).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가치요인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코로나 전·후 비교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지, 21(4), 43-61.
- 구혜경, 조희경(2015). 주거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선호 연구-주택 구입 예정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6(2), 37-64.
- 김성훈(2022). 코로나 19 이후 주거환경 및 건축의 변화. 건축, 66(11), 53-56.
- 김아롬, 홍형옥, 김수미(2014). 대학생 1인가구의 주거중요도와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식 및 선호.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307-312), 서울, 한국.
- 김영진, 예지희, 이세빈, 김미경(2022). COVID-19 팬데믹 기간 ‘오늘의 집’ 앱에 나타난 원룸형 주거 인테리어디자인에 대한 거주자 선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pp. 204-208), 서울, 한국.
- 김준형(2021). 주거선호를 고려한 청년주거지원의 방향: 서울시를 사례로. Urban Planners, 8(2), 30-35.
- 김지숙, 양세화(2010). 단독주택에 대한 울산시 거주자의 주의식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8(6), 35-46.
- 김지현, 곽경숙(2007).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환경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651-664.
- 김태완, 장미선(202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주생활행위 변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6), 81-90.
- 박은아, 이연정(2011).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1(p. 314). 서울, 한국
- 신화경, 조인숙(2014). 대학생의 주거의미 및 주거선택시 고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3(5), 957-968.
- 심승규, 지인엽(2021). 생애주기별 주택소유와 주거유형: 연령대별 손바뀜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토지주택연구, 12(4), 31-40.
- 안옥희, 강혜경, 조영미(2009). 대학생 주거관의 시계열적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4), 113-120.
- 윤신영, 강순주(2018).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주거가치관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449-452). 서울, 한국.
- 윤호(2014).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20, 367-402.
- 이경희, 윤정숙, 홍형옥(1993). 주거학개설. 서울: 문운당
- 이소영, 엄순철(2018).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요구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2), 77-85.
- 이민아, 유복희(2017). 대학생이 인식한 주거의미 및 이상적인 주거환경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6), 41-52.
- 이지선, 이영민(2019). 이동과 정주가 공존하는 경계위의 집: 혼자사는 청년들의 ‘집 만들기’실천과 ‘집’의 의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93-109.
- 이현정, 우빈, 박아람, 이경희(2012). 한·중 대학생의 주거관과 주택선택시 고려사항.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327-332). 서울, 한국.
- 이현정, 지은영(2021). 청년의 주의식 군집과 주거 내 활동.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83-96.
- 이현주, 박민경, 안옥희(2021). 대구권역 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61-70.
- 임혜리, 김재준, 김경훈(2012). 가족생활주기별 주거가치관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1), 1226-9093.
- 임희경(2005). 대학생의 생활스타일과 주거의 선호성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1047-1058.
- 정미렴(2023). 수도권 1인 청년가구의 주거관과 주거개선노력.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351-354). 서울, 한국.
- 정수진, 한정원(2017). 임대주택 계획의 다양화를 위한 20-30대의 주거의식과 요구분석-부산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3(8), 37-46.
- 조현경, 서지은(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의 가구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1), 91-98.
- 주거학연구회(2013). 넓게 보는 주거학. 경기: 교문사.
- 주서령, 김도연(2014). 한·중 대학생의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4). 111-123.
- 최윤정, 유복희, 이민아, 김진희, ... 채혜원(2024). 가치공유의 주거학. 경기: 교문사.
- Beyer, G. H. (1959). Housing and personal values (Memoir 364). Ithaca, New York: Cornell Univ.
- Culter, V. F. (1947). Personal and family values in the choice of a home(Bulletin 840). Ithaca, New York: Cornell Univ.